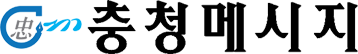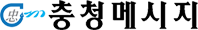정치에 선한 게 어디 있고 악한 게 어디 있느냐고 묻겠지만, 구태여 정치를 이분법으로 나누면 그렇게 분류가 가능하다. 혹은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얼마 전 ‘돌담의 시학’이란 글에서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청산도 돌담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땐 무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바닷가에 난 물결자국인 연흔(連痕)과 전복 껍데기로 만드는 나전칠기를 통해 윤석열의 악한 정치를 비판해 보고자 한다.
파도가 들고 나야 생기는 연흔
바닷가에 가면 마치 등고선 무늬 같은 물결 자국이 수없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연흔(連痕)이다. 그러나 그 물결자국이 연흔이란 걸 아는 사람도 드물고, 안다 해도 그저 신기하다 정도만 느낄 것이다.
좋은 시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과 정교한 예술성이 발현된 시다. 그렇다고 필자가 좋은 시를 썼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시인은 일반인이 갖지 못한 예민한 감수성과 그것을 아름다운 시어로 형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먼저 필자의 졸작 시학(詩學)1- 연흔(連痕)을 감상해 보자.

詩學1- 연흔(連痕)
바닷가에 가서 좁은 마루에 난 등고선 같은 무늬를 보고 파도가 그려놓은 지도라고 노래한 시인의 고향은 바다가 보이지 않은 도시가 분명하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파도의 자맥질로 생긴 연흔(連痕)에는 각기 다른 등고선이 완만하게 누워 있어 편한 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세월은 저 무늬를 만들어내느라 무릎이 닳았다.
파도는 밀려오다 갯벌에 부딪치고 그 사나운 성질머리도 한 풀 꺾이는 법이니 차츰 작아진 강도가 아래쪽으로 전달되어 저 오묘한 무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계속 앞으로만 가는 파도는 어떤 무늬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법, 앞으로 가다가도 물러날 줄 알아야 그 흔적이 결 고운 무늬로 남아 더 아름다운 것이다.
이 시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세월은 저 무늬를 만들어내느라 무릎이 닳았다.’와 ‘계속 앞으로만 가는 파도는 어떤 무늬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법’이란 구절이다.
측은지심이 없는 정치가는 자신이 불행해져
모름지기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의 고달픈 삶에 측은지심을 갖고 그들이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어야 한다. 측은지심이란 상대의 삶을 이해하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가 그런 사건을 일으켰는지 현상보다 본질을 들여다보고 내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는 항상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는지 밤낮으로 고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술이나 마시고 정적 죽일 궁리만 하면 자신의 건강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 지금 윤석열이 그렇다.
다음에 소개할 필자의 시는 시학(詩學)2- 나전칠기다.

시학(詩學)2- 나전칠기
늙은 장인(匠人)은 딱딱한 전복 껍데기를 갈아 파도 같기도 하고 노을 같기도 한 오묘한 빛을 찾아내 천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저 황홀한 무지개를 만들어낸다.
장인은 그 빛이 전복을 키우느라 등골이 휜 껍데기의 세월이란 걸 알기에 작은 한숨 하나도 함부로 갈지 않는다.
지상의 작은 것들은 바람과 파도와 세월이 밀려오다 잠시 멈추었을 때 그 슬픈 회고록을 남기는 것이다.
이 시에서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은 ‘ 함부로 갈지 않는다.’란 말이다. 나전칠기를 만드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장인은 작은 전복 껍데기 하나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장인은 전복 껍데기 속에 숨어 있는 오묘한 빛에서 삶의 고통을 발견하고 조심조심 다루어 무지개 같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을 정치로 환언하면,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의 하찮은 삶에도 애정을 갖고 그 맑은 가난 속에서도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 소개할 노랫말은 필자가 작사 ‘나도 아프다’이다.

나도 아프다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저 눈매 선한 사람들은
무슨 꿈을 꾸며 살고 있을까.
손잡이를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 밀려가지 않으려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있네.
관성의 법칙은 그저 과학이지
그래도 출근할 회사가 있다는 건
무척이나 행복하다는 뜻이지.
사방에 출근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
지하철 복도에서 다리 아래 천막에서
구겨져 자고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
숨이 막혀오고 어깨가 아플 때
붕어 입 닮은 손잡이가 말하네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여기 멈추~고 저~기 멈추고
숨이 차오른 버스가 말하네
나도 아프다, 나도 아프다.
정치 지도자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에 늘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기레기들에게 공정보도를 부탁하는 것과 같고, 검사들에게 공정수사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문학이 정치고 정치가 문학이다. 여백의 미니 삶의 관조니 하고 떠들어 대는 이마가 흰 사람들은 정작 시를 쓸 줄 모른다.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정작 정치를 모른다. 시가 어려울 필요가 없듯 정치도 어려울 필요가 없다. 밥상이 정치요, 정치가 밥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