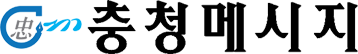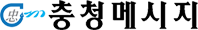이미 몇 번인가 언급했듯 대구는 잊지 못할 곳이다. 이상화의 시뿐이 아니라 대구 시민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내 젊은 인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승만 독재 시절 경북고 학생들이 반독재 투쟁을 벌였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학생운동의 효시였다. 내가 그 힘든 군대생활 속에서 편안함이 보장된 서울을 마다하고 대구를 선택한 것은 보통 결심이 아니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대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됐다.
군대를 너희 맘대로 오고 가느냐고 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이다.
부대장과 군대 동기인 당숙이 다녀간 후 얼마 동안은 이등병의 고통을 면할 수 있었지만, 날이 지나자 상황이 변했다. 내가 빽 믿고 까분다는 것이다. 부대장도 전속됐고 나는 완벽하게 끈 떨어진 망건(網巾) 신세가 됐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 간단 말인가. 군 생활을 해 본 사람은 안다. 외톨이의 고통. 말단 쫄병을 상대해 주는 것은 사역과 보초였다. 이럴 때 생각하는 것이 탈영이다. 그러나 죽어도 탈영은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탈영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내게 낭보가 전해진다. 작은 고모부가 대구전신전화국장으로 부임한 것이다. 전화국장쯤 우습게 알지 모르지만 60년대 사설전화 놓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고모부는 나의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서울로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군대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느냐고 항의겸 하소연을 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던 고모부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 며칠 후. 무슨 기적 같은 소식인가. 서울로 전속명령이 난 것이다. 드디어 대구를 떠날 수 있게 됐다. 고모부는 대구지역 특무대장(CIC)과 교분이 있었으며 전화 한 대를 놔 주기로 약속하고 나를 서울로 전속시킨 것이다. 내 인사기록 카드를 들고 온 사병계는 ‘니 참 빽 좋데이’ 부러움이냐 비웃음이냐. 욕을 해도 좋다. 대구만 떠날 수 있다면 악마와 입이라도 맞추마.
마지막 대구의 일요일. 다시 달성공원을 찾았다. ‘상화시비’ 앞에 섰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이상화의 시 ‘나의 침실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다시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이제 다시는 이곳 ‘상화시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읽어 내려갔다.
나의 침실로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련도다.
아, 너도, 먼동이 트기전으로, 수밀도(水蜜桃)*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마돈나」 오려무나, 네 집에서 눈으로 유전(遺傳)하던 진주(眞珠)는, 다 두고 몸만 오너라.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 모르게 숨는 두 별이어라.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둔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아, 어느덧 첫닭이 울고 ― 뭇 개가 짖도다. 나의 아씨여, 너도 듣느냐?
「마돈나」 지난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 둔 침실로 가자, 침실로!
낡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국 ― 오, 너의 것이냐?
「마돈나」 짧은 심지를 더우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마음의 촛불을 봐라.
양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窒息)이 되어, 얕푸른 연기로 꺼지려는도다.
‘마돈나’ 오너라. 가자, 앞산 그리매가,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이곳 가까이 오도다.
아, 행여나 누가 볼는지 ― 가슴이 뛰누나,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마돈나」 날이 새련다, 빨리 오려무나, 사원(寺院)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
네 손이 내 목을 안아라. 우리도 이 밤과 같이, 오랜 나라로 가고 말자.
「마돈나」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내 침실, 열 이도 없느니!
아, 바람이 불도다. 그와 같이 가볍게 오려무나, 나의 아씨여, 네가 오느냐?
「마돈나」 가엾어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없는 소리를 내 귀가 들음은―.
내 몸에 피란 피 ― 가슴의 샘이, 말라버린 듯, 마음과 몸이 타려는도다.
「마돈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끄을려 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 내 침실이 부활(復活)의 동굴(洞窟)임을 네야 알련만······.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얽는 꿈, 사람이 안고 궁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아,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 모르는 나의 침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마돈나」 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 하고, 어둔 밤물결도 잦아지려는도다.
아, 안개가 사라지기 전으로 네가 와야지,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눈물이 흠뻑 젖은 채 부대로 돌아왔다.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함께 근무하는 전우들이 막걸리를 놓고 송별회를 열어줬다. ‘빽 좋다’는 부러움 섞인 농담과 함께 권하는 술을 사양하지 않고 마셨다. 마음껏 취하고 싶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으랴. 다시 만날 때 우리 서로 미워하지 않는 민주동지로 만나자. 이 땅에는 대구만 있지 않고 부산과 광주. 삼천리금수강산이 있단다.
나를 경원(敬遠)하던 전우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정말 대구를 사랑해서 서울근무도 마다하고 찾아 왔지만 모략까지 당했다. 훈련소 중대 향도를 할 때 애들끼리 싸움이 있었는데 내가 호남출신 편을 들었다는 모략이 있었던 것이다. 가짜뉴스가 퍼졌을 줄 누가 알았겠나. 미워했던 마음은 오늘 밤 저 하늘에 띄워 보내자. 우리는 동지다. 서울에 오면 꼭 나를 찾아라. 내가 막걸리를 사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의 진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한 녀석이 일어나 다가오더니 나를 끌어안았다. 이어서 모두 일어나 박수치며 이별을 아쉬워했다. 내 마지막 대구의 밤은 이렇게 끝났다. 그렇게도 원망하던 대구가 가슴 가까이 다가왔다. 그렇다. 그들과 나와 무슨 원한이 있으랴. 모두가 그 원수 같은 지역감정과 잘못된 정치 때문이다.
다음 날. 나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대구와 이별이다. 그러나 내가 시인 이상화를 사랑하듯 대구를 영원히 사랑한다. 사랑하는 대구여. 사랑하는 대구여. 내 마음은 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