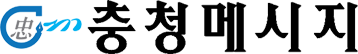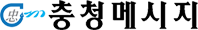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버지도 압도하는 ‘위대한 엄마’

◇열다섯의 성공
위험한 일을 피해 보자고 용접에 눈독을 들였다. 열심히 용접공을 쫓아다니며 조수를 했지만 기술을 배울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행인지 아주냉동이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곧장 다른 공장을 구해왔다. 나는 또 다른 공장으로 떠밀려갔다. 스키장갑과 야구글러브를 만드는 대양실업이었다.
그곳에서 ‘시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프레스기를 익혔다. 샤링기 유경험자, 매서운 눈썰미와 일머리 덕분에 나는 다른 소년공들보다 빨리 프레스기 한 대를 차지하게 되었다.
무려 프레스공! ‘나름 성공한 열다섯이었다’라고 쓰려다 만다. 성공은커녕 고무기판 연마기에 손이 남아나질 않아 공장을 옮겼더니, 더 위험한 샤링기를 만났고, 샤링기에서 떠나오니 프레스기 앞에 앉아 있었다.
세상은 소년공의 안전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대양실업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권투경기가 열렸다. 권투가 인기 있던 시절이었다. 경기는 점심시간 공장창고에서 벌어졌다.
직원 단합이나 복지 차원의 경기는 아니었다. 선수는 신참 소년공들이었고, 선수 지명권은 반장과 고참들에게 있었다. 지명당한 소년공들은 무조건 글러브를 끼고 나가 싸워야 했다. 그리고 고참들은 자기들이 먹을 ‘부라보콘’ 내기를 걸었다. 그리고 그 부라보콘 값은 권투 아닌 격투기에서 진 신참 소년공의 몫이었다.
하고 싶지도 않은 경기를 해야 하는 소년공은 경기에 지면 돈까지 내야 했다. 나도 지목당하면 꼼짝없이 경기에 나갔다. 한 달 용돈이 500원인데, 부라보콘은 100원이던가? 경기에서 지면 부라보콘 세 개 값인 하루 일당을 고스란히 빼앗겼다. 정말 '개떡'같은 경기였다.
나는 그때 이미 왼팔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벼락같이 떨어지는 육중한 구형 프레스기가 왼쪽 손목을 내리치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조금만 더 늦게 팔을 뺐다면... 손목이 부어올랐지만 타박상이려니 하고 빨간약과 안티프라민 연고나 바르고 말았다. 손목뼈가 깨졌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기가 가라앉은 뒤에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고 프레스기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아팠다. 내색하면 프레스공 지위를 잃는다. 그래서 아픈 걸 참고 숨기며 더 열심히 일했다. 그게 평생의 장애가 될지 그땐 몰랐다. 프레스기에서 밀려나지 않는 것만 중요했다.
권투를 배워본 적도 없는 소년공들은 친구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형편없이 맞아야 했다. 이기든, 지든 우리는 투견장에 끌려 나간 강아지 같았다. 덩치가 작고 체력이 약하던 나는 경기를 빙자한 싸움에서 대부분 맞고 돈까지 뜯겼다.
맞는 것도, 때리는 것도 싫었다. 거기에 돈까지 뺏기면 기분이 정말 엉망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그저 공장을 옮기겠다는 말만 반복해 중얼거렸다.

◇중학과정 석 달 공부
공장에서 맞지 않고, 돈 뜯기지 않고,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공장 밖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홍 대리!
눈이 튀어나와서 개구리눈이라 불리던 홍 대리. 그는 공장의 ‘왕’이었다. 반장도 홍 대리 앞에선 꼼짝 못했다.
홍 대리처럼 되고 싶었다. 홍 대리는 어떻게 대리가 되었는가? 중요한 화두였다. 슬쩍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의외로 답은 단순했다. 고졸이었다. 아, 고졸! 나는 원대한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일기장에 꾹꾹 눌러쓴 목표는 이러했다.
첫째, 남에게 줘 터지지 않고 산다
둘째, 돈을 벌어 가난에서 벗어난다
셋째,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산다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가 반대하는 야간학교 말고 다른 방법을 찾던 중 검정고시 학원이란 게 있다는 걸 알아냈다. 시험은 8월 초, 13주 가량 남아있었다. 아버지도 석 달 남짓 야간 검정고시학원에 다니는 것은 허락했다. 3년 공부를 석 달 안에 해보기로 했다. 터무니없고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내가 출세한다던 점쟁이의 말도 있지 않은가? 거기다 귓불도 성공할 상이라 했는데...
퇴근하면 곧장 학원으로 달려갔다. 3킬로미터의 거리를 버스도 타지 못하고 뛰고 걷는 날이 많았다. 돌아올 때는 당연히 걸었다. 노트와 필기구를 사느라 용돈을 다 써버려 버스비가 거의 없었다. 버스비에 관한 억울한 기억도 있다.
당시 학생들은 할인을 받았지만 같은 또래의 소년공들은 일반요금을 내야 했다. 부당했다. 나중에 대입학원에 다닐 때는 그래서 머리를 박박 밀었다. 학생처럼 보여서 할인요금을 내기 위해서였다.
기진맥진해서 학원에 도착하면 찬물로 세수를 하고 수업에 들어갔다. 왜 그리 덥고 졸리는지... 화장실 냄새는 왜 그리 독한지...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처음으로 ‘칭찬’이란 걸 들어본 까닭이다. 공부를 잘한다는 선생님들의 칭찬은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인정이었다.
학원에서 심정운도 만났다. 그도 소년공이었고 수업이 끝나면 나처럼 남아서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가며 자습을 했다. 우리는 당연히 친해졌다. 친구 심정운은 그 시절의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재명이는 암기력이 특출나서 선생님들에게 최고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재명이는 3개월만에, 나는 4개월만에 합격해보려고 죽자고 공부를 했지요. 재명이는 여름인데도 반소매를 입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팔을 다친 걸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죠.”
시험이 한 달 남았을 때 도저히 공장을 다니며 공부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 아버지에게 한 달만 공부에 매진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돌아온 것은 공장이나 똑바로 다니라는 무뚝뚝한 말이었다. 그때 나선 것이 엄마였다.
“학원비도 지가 벌어 댕기는 아한테 그게 할 소리니껴? 남들은 다 학교 보내는데, 부모가 돼서 우리가 해준 게 뭐가 있니껴?”
여간해서는 아버지에게 맞서지 않는 엄마였다. 아버지가 주춤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직권으로 내게 명령했다.
“공부해라! 내가 속곳을 팔아서라도 돈 대주꾸마.”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버지도 압도하는 ‘위대한 엄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