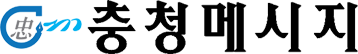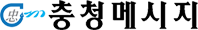【팩트TV-이기명칼럼】광화문 광장이다. 수만 명이 모였다. 무슨 일인가. 전광훈이 또 반정부 집회를 하는가 했는데 어딘가 이상하다. 전광훈 집회라면 노인들이 많을 텐데 별로 없다. 젊은 친구들이 태반이다. 한 젊은이가 단상에 올랐다.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파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파기라니. 그러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의사란 말인가.
“우리가 의사가 되던 날 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마지막으로 낭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십시오.”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선언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의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는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꾸고 싶지 않은 꿈
이런 것을 일컬어 미친 개꿈이라고 할 것이다. 미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개꿈을 꾸었을까. 너무 답답해서 아니었을까,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말에 동의할 것이다.
여기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아무리 외쳐본들 소용이 없다. 이미 히포크라테스를 망각했으니까.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했다. 코로나19로 환자들이 신음하고 죽어간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한 구절을 다시 불러주마.
‘나의 환자와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잊었는가.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개 한 마리가 물로 뛰어들었다. 개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냈다. 주인도 아니다. 개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으로 물에 뛰어든 것이다. 주위에 버려진 환자는 없는가. 아픈 사람을 버린 의사는 없는가.
전쟁서 총을 쏘는 것은 적을 죽이기 위해서다. 적이 아군 총에 맞았다. 살아 있다. 군의관(의사)이 살려낸다. 의사는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에 의사들의 허락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번 집단휴진으로) 의료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의사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걸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결코 의사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파업(집단휴진)을 멈추어 주십시오.”
어느 전공의가 쓴 글이다. 어떤가. 아무 느낌들이 없으신가. 사람마다 나름대로 욕심이 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같다. 전공의들은 최고의 지식인이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의학을 전공한다. 그러나 무척 힘들다. 십수 년을 넘게 수련하고 어렵게 시험에 합격한다. 개업해도 어려움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역시 의사는 선택받은 직업으로 인식된다. 어디를 가서나 ‘선생님’이다. 선생님의 손에 병든 인간의 목숨이 달려있다. 코로나19 감염자들의 목숨도 같다. 한데 환자를 떠났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생각하면서 진료를 거부한 의사가 있었을까.
■개가 병이 들어도
이웃에 동물병원이 있다. 환자가 많다. 수의사들이 정성 들여 치료를 한다. 옛날 영양탕 재료로만 생각되던 때와 어찌 비교를 할 수 있으랴. 당연하다. 생명이기 때문이고 의사는 생명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카 한 명은 의사고 한 명은 의대 교수다. 집안 모임에서 만났는데 의사파업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서로의 생각을 알기 때문이다.
“심장이 멎어가던 아빠가 네 군데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의료진과 장비가 이미 부족해진 상황에서 의료파업(집단휴진) 강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계속 아프고 죽어야 하느냐. 누가 대답을 해다오.
‘젊은 의사 비대위’라는 것이 있다.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수술이 미뤄지고 환자가 죽어가는 현실에 대한 사과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깜박 잊었을까.
생명은 귀하다. 의사는 아픈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 얼마나 많이 들은 말인가. 그래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의사는 아픈 사람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